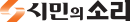나노기술은 훨씬 넓고 깊게 과학기술의 혁명을 예고한다. 전자 및 정보통신은 물론 기계, 에너지, 환경, 우주항공, 식량, 건강, 기후변화 등 물질현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나노 세탁기’ ‘은나노 양말’ ‘나노화장품’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나노’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길거리 간판에서도 ‘나노’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과학(science)은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원리를 밝히고, 기술(technology)은 과학이 밝혀낸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과 시스템을 만든다. 나노기술이 오늘날 산업화로 이어지기에 앞서 나노과학은 훨씬 오래 전부터 연구돼 왔었다.
나노과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 리처드 파인만(Richard P. Feynman)이다. 1959년 파인만은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나노세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강연이었다. 파인만은 나노기술이 발달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머리 핀 하나의 작은 크기에다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뒤 1980년대 초반 그의 예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현됐다. 1981년 스위스 IBM연구소에서 원자와 원자의 결합상태를 볼 수 있는 주사터널링현미경(STM)을 개발하면서부터 나노세계의 엄청난 비밀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됐다. 나노크기 미립자가 매우 규칙적인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내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르게 발전한 것이다. 다시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나노 미립자를 이용하는 방법, 즉 나노기술을 본격적으로 터득하였다.

탄소는 석탄이나 연필심,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원소다. 나노기술로 탄소의 배열을 다르게 하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했다.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다. 하지만 나노구조를 바꾸니 철강보다 몇 배나 강도와 탄성이 강하고, 전기도 잘 통하는 새로운 물질로 변했다. 여태껏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다.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강도와 탄성 때문에 활, 스키, 야구배트, 테니스라켓, 골프채, 자전거프레임 등 스포츠용품에 널리 사용됐고, TV나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의 전자 발생장치로도 사용된다. 미국 NASA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길게 꼬아서 케이블을 만들면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우주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야심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그래핀’이라는 새로운 나노물질이 탄생하면서 또 한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켰다. 그래핀은 탄소나노튜브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어 훨씬 다양한 용도로 여러 산업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혁명은 단지 미립자분야에서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다. 모든 생명의 가장 기초단위인 세포의 비밀을 밝히고, 세포가 움직이는 원리를 통제하는 기술과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간유전자, 즉 인간게놈의 비밀을 2003년 해독할 수 있었던 것도 나노기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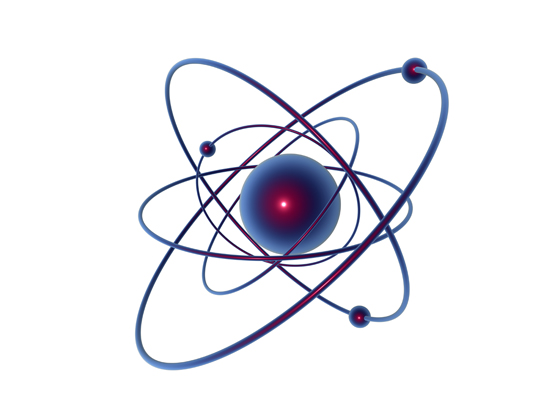
반도체 분야에서 나노기술은 ‘낸드플래시’라는 고집적 고용량 메모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오늘날 스마트폰 혁명을 가능하게 한다. 나노기술은 물리, 화학, 소재, 농업, 생명공학, 우주항공, 전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기술로 자리잡아가면서 21세기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