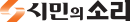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집안에서 조신하게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회정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기 시작한다.
당시 우리나라 네 번째 ‘여의사’이자 광주에서 최초로 개업을 하게 된 ‘여의사’ 현덕신은 바로 그 틀에 박힌 선입견을 깼던 인물이다. 그녀가 호남에서 펼친 여성운동을 더듬어본다.
일찍이 개화사상에 눈떠

현 여사는 1896년 황해도 해주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다. 그녀는 황해도 출신이지만 담양출신 최원순 선생을 만나 광주에서 계몽운동, YWCA 등 다양한 맹활약을 펼치게 된다.
당시 아버지는 선교사였고, 단 하나뿐인 친 오빠 현석칠은 목회자였기에 남보다 먼저 개화에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해주에서 보통학교까지 다니게 됐다. 이후 서울로 이사를 하고 이화학당까지 입학하면서 열성을 띠며 학업에 임했다고 한다.
일찍이 교육을 접했던 현 여사는 일본강점기 시절 배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일본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계속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보람 있는 사회활동을 할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집어치우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했었다.
일제강점기 중 동경 유학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그녀는 1916년, 20세가 되던 해 후자가 아닌 전자 쪽을 선택해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술을 배우게 된다.
일제시대 속에 동경유학 중이었던 그녀는 “너는 어디 출신이며, 지금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떳떳하게 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우리민족의 존재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돼”라는 오빠의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며 지내왔다.
현 여사는 동경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허영숙, 정자영, 박정자 등에 이어 한국 여성으로써 4번째 의학도의 길을 이어갔다. 그러던 1919년 2월 18일. 일본 동경기독청년회관에서는 1919년 3.1만세운동의 첫 신호탄이 되어준 ‘조선청년독립단’이 발족하게 됐다.
그녀 역시 조국을 위해 일 해야겠다는 각오로 2개월 학비에 해당하는 큰 돈 40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조국 광복을 소원했던 유학생들과 뜻을 모아 사기를 북돋았다.
결혼 이후 광주 부인병원 최초 개업

한편 현 여사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한국 최초 여성진료 기관인 동대문 부인병원(현 이화여대병원)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1919년 2·8선언을 참여했던 남편 최원순이 일제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해 지병을 얻고 결국 남편과 함께 1928년 광주로 함께 내려오게 된다.
그녀는 동구 남동에 광주 최초로 ‘현덕신 산부인과병원’을 건립해 호남 최초 여의사가 되어 여성 계몽운동에 나섰다. 특히 가난한 부녀자와 어린이 진료에 헌신하며 여성운동과 문맹퇴치를 위해 남다른 애착을 갖고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계몽운동에 앞장선 여인이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