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년 전 백화점 안 갤러리에서 만난 그의 그림은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온통 검은색에 형체마저 잘 잡히지 않은 그의 그림들은, 보면 볼수록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갤러리 안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푹신해 보이는 채색 안 된 검은 의자들이 주류였다.
대부분의 의자들이 의자가 갖는 일반적인 통념을 거부하고 있었다. 어떤 의자는 가슴이 먹먹해 올 정도로 검었고, 어떤 그림은 그 검은 칠들을 다시 혼신의 힘으로 벗겨 낸 흔적들도 보였다.
먹을 이용해 계속 덧칠하거나 벗겨낸 그의 의자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의자들보다 도전적이었고 그런 연유들로 전시장에 들어섬과 동시에 검고 거대한 의자들에 압도 되었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다.
“네가 앉았던 의자들은 단지 의자가 아니야, 시간과 새벽의 미명을 잠깐, 아주 잠깐 스치듯 보았던 것일 뿐이야” 의자의 누군가 앉았던 선명한 자국이 의자의 바닥에, 없는 듯 존재하며 긴 혀를 빼물고 있는 뱀과 함께 말하고 있었다.
“의자는 현대인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대리한다. 의자는 의미가 탈색되고 변형되어 최소한의 의미만 남겨두고 어둠(먹) 속에 가려진다. 형태의 왜곡을 통한 일상적 의미의 전복과 해체를 기도한다” 작가가 그 시절 소통하고 싶은 언어 중 가장 선명한 것이 ‘의자’였다고 고백한다.

전시와 작업은 늘 한 몸이지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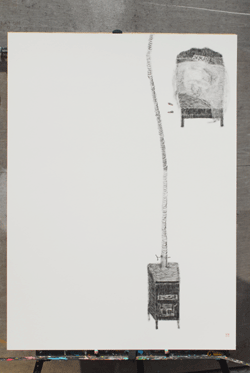
“전시를 위해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작가는 항상 여러 가지 실험을 같이 하고 있다. 의자를 그리는 동안에도 수인 판화를 실험하고 있었기에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같다” 맞는 말이다.
수인(水印)판화. 천장 높은 작업실 바닥에 주욱 놓아주며 작품을 설명하던 그가 낯선 단어들을 설명했다. 용어도 생소한 수인판화는 역사가 오래된 동양적인 판화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방법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수인판화가 체계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서양의 인쇄술이 들어오면서 수인판화의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을 사용한 서양의 ‘판화’방식이 대중화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재 수인판화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광주지역에서도 그가 거의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책자를 만들 때 소규모로 수인판화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인판화는 기법이 풍부하다. 서양판화가 명확하고 선명하다면 수인판화는 산수화처럼 번짐 현상을 살릴 수 있다” 이제 그가 제작했던, 열흘 전 만났던 판화의 안개 같은 느낌을 알겠다.
자연 그대로를 찍어내고 섬세하게 기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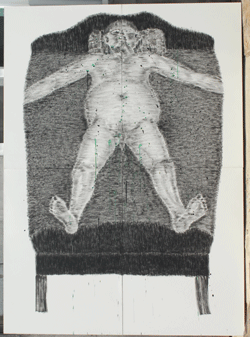
나뭇결무늬가 놀랍도록 섬세하게 드러나 있는 소쇄원 시리즈는 특히 더 깊은 맛이다. 한 그루 소나무, 한 개의 돌, 한 채의 집이 그려져 있을 뿐인데 그림 안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을 만큼 깊고 넓다.
일정 거리를 두고 사물을 해석하는 방법이 탁월하다. 간단히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 편안함, 담백함 등이 그의 그림 안에는 녹아들어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의 구조로서 그가 선택한 것이 판화였다’고 그는 고백한다.
운주사 불상은 또 어떤가. 불두만이 그려진 판화는 판화가 아닌 채색 옅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인다. 번지는 먹들이 각각의 형태를 띄우며, 무언가를 말하며 그만큼의 속도로 마음 깊이 다가온다.
우문(愚問)처럼 작품의 이미지나 오브제는 어디서 찾느냐고 물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 가구, 용품, 기억, 가족 등 모든 것이 오브제이며 그 안에 모든 이미지를 에스키스 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맞다. 살아가면서, 작가로 만나는 시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오브제다. 작가의 시선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다른 세상, 본질 이상의 그 이면은 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래서 화선지만 고집하지 않고 먹이 묻는 재료는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붓뿐이 아니고 손으로 긋기도 하고 찢어낸다. 거칠고 지저분하고 모호하게 보여도 맑게 보일 수 있고, 맑게 보여도 지저분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런 작업을 계속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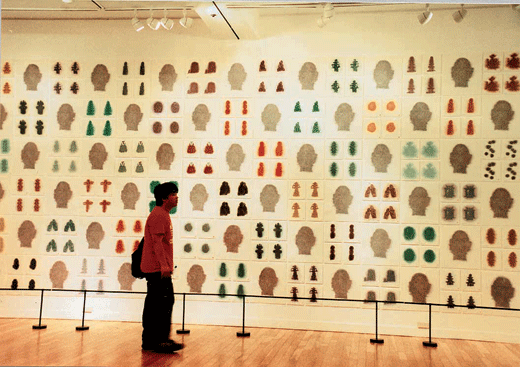
프롤로그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내 선친이 누워 계시는 산허리 근처였다. 가는 길도 다시 돌아오는 길도 마음이 애잔했다. 가을 코스모스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피어가는 갈대는 하얀 색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르지 않은 생각은 더 이상 크기를 멈춘다. 길 가운데서 해지는 산을 바라보는 것은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다. 신발 뒤축에 가지고 간 외로움과 괴로움. 맨 발로 서 있다 보면 뼈끝까지 스미는 발 시름으로 사라진다.
작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가을바람과 함께 서늘해졌다. 늘 암송하던 시가 한 구절 입 안을 맴돌았다.
마음 안쪽에 씨앗 하나를 심었지. 주기가 커 가면서 불꽃을 피우더군. 모든 탈 것들 연기를 날리며 중심에서 밖으로 세차게 번졌지 더 이상 태울 것 없을 때 제 몸 잘라서 여문 불씨를 살려갔지.
팔 다리 하나씩 잘라 넣고 서로를 바라보던 눈을 심장의 펄떡거림을 던져 주고 나니 가슴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더군 아름다운 독설들만 사윈 재처럼 날아갔지.
뒷날에 뿌리까지 내린 비로, 떨어져 사윈 재들 흔적 없이 내려갔지. 그 빈자리에 고인 물들 환희와 쾌감의 그릇 밖으로 경쾌한 보폭의 길을 만들어 나나갔지 흐르면서 마음의 앙금들 다 가라 앉히고 하류쯤 가서 삼각주 하나 만들거나. 혹은 지하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 오랜 세기를 턱 괴고 앉아 있다가 뜨겁게 솟구치며 포용하는 유황천으로 다시 만나야 해
-이제 물로 만나야 해. 문 정영作
|
▲김상연 작가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심양의 노신대학과 항주의 중국미술원에서 6년 동안 전통목판수인을 공부했다. 93, 94년에 광주에서 개인전과 2000년 일본 경경에 있는 화랑에서 초대개인전을 했고 이외수차례 단체전과 기획전에 참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