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로그
<콜롬비아 출신의 베탕쿠트신부는 착취당하는 소작인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코와 귀, 혀를 잘리고 끝내는 질식사 당해 우물 구덩이에 내던져졌다.> ‘고통이라는 걸림돌’(성 바오로 출판사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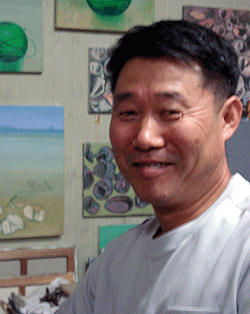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거대한 휴화산으로 담대하게 반응한다.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영역이다. 그가 꿈꾸던 세상은 무엇일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조개껍질 밖에 나선으로 그려진 세월의 흔적 안에 물과 파도와 시간, 인연들. 또 무엇이 함께 작용해 자신만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울음을 견뎌야 한다. 깊은 밤에 자신을 깨우는, 소리 죽여 우는 통증을 침묵으로 이겨내야 한다. 웃으며 때로는 슬픈 표정으로 평화로운 나날을 기다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소중함과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소중함을 한꺼번에 몸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현대미술은 수 백 개 이상의 표정을 갖고 있다
작가는 ‘다름’과 ‘틀림’의 미학을 완전하게 인식한다. “현대 미술은 각각의 표정을 갖고 있다. 분야가 다르다 해서 서로를 멸시하거나 밀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도권미술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항변한다.
예술은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변화 속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배우고 익혀가는 낮 설음 속에서 소통되고 인식된다.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발견되고 <다름>은 다름의 미학으로 발전한다.
<틀림>은 나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의견일 뿐이다. 틀림은 어긋나거나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작가가 작업을 하는데 있어 틀린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와는 다른 작업일 뿐이다”고 작가는 한숨으로 말한다.
작가는 이 지역에 만연해 있는 <다름>과 <틀림>을 인정해주는 풍토를 절실하게 바라며 아쉬워한다. 아니, 이제는 아쉬워하며 애타는 마음도 이미 사라졌다.
젊은 날 자신의 작업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현재는 오히려 다른 것이 아닌 정말로 틀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혹은 자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십이 넘은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시간과 건강, 경제력이 조금만 허락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죽기 전까지 작업을 하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유년 시절은 자신의 작품으로 되살아 나
화랭이가 안내한 바닷길 구만리 / 살은 볏짚으로 덮고 / 뼈는 갈매기 둥지에 품고 살아가리 / 남도 바람에 세간일 듣고 / 관고개 넘나드는 까마귀귀등에서 날 보내다가 / 낡은 어선으로 어망질하여 / 한 삼 년 살다보면 / 조금 서운해도 / 품은 뼈에선 극락조가 날으리라 // 팔목의 한은 염기로 녹슬이고 / 동공은 낙숫물로 씻다보면 / 두고 온 아내는 / 삼년길 다 간 후에 / 다시 둥질 틀어 품다보면 / 사방으로 사방으로 / 외로운 삼 년이 지나리라 // 아! / 서러운 남도 바람에 / 네 귀는 떨리고 / 볏짚은 흐트러져도 / 다시 삼 년은 지나리라
- <초분1>. 1991년. 장 대송作

작가의 작품 안에 등장하는 오방색의 기초는 어린 시절 자신이 낳고 자란 섬. 신지도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시절, 내가 보았던 화려한 우리 민족만의 색채는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내 모든 것의 시작은 신지도, 고향이며 끝도 아마 그곳에서 마감할 것이다”
사람이란 우주는 제각기 종말의 시간을 순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큰 곰 자리에 있는 성운(星雲)이 지금도 매 초 4만Km(광속의 7분의1)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
작가는 매 번 어느 간절한 사람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젊었던 어느 날 떠나 온 고향으로 간다. 낡은 옷 훨훨, 벗어 버리고 미역냄새 마시러 고향으로 간다.
어린 시절 언뜻 보았던 고향의 초분은 작가의 눈에 그림자처럼 각인되었다. 결혼식 역시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화였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은 솜사탕처럼 녹여 자신의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공명(空鳴)의 세계 - 비움과 채워짐 그리고 순환
작가는 광주 시립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창작 스튜디오 1호다. 작가의 작업 안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다. 회오리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LP 레코드 판에 기록된 음질을 읽어내는 수없이 많은 선들의 회오리와 귀에 대고 들어보는 소라껍질 안, 시간의 회오리가 바로 그것이다.

시간과 시간이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영원 속에서 만들어지고 기록되는 흐름인 회오리를 작가는 ‘공명(空鳴)’으로 표현한다. 공명에서 ‘공(空)’은 비어있는 우주 공간 그 자체이지만 ‘명(鳴)’은 울림이다.
비어 있는 우주 안에 회오리처럼 극이 극대화되어 확장되는 것이 공명이다. 공명 안에는 지연과의 대화 뿐 아니라 그가 대화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정신적, 물질적인 강으로 흐른다. 또 거듭거듭 촘촘한 체에 걸러지고 밭쳐져 소라껍질 안의 시간의 회오리로 나타난다.
그가 말하는 회오리는 채워져 가는 기(氣), 자연과의 교감, 순환, 인간의 만남, 인연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공명의 구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다”고 작가는 망설임 없이 말하며 “소라껍질을 통해 현대의 시간의 울림을 들으며 마음을 비우고 행복해져야 한다.
감정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 되어 늘 걸어 온 뒤를 뒤돌아보며 한 템포 늦은 여유를 가져야 하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작가는 이런 마음이 비롯되어 경기재단이 주최하는 ‘금강 미술 비엔날레’에서 ‘별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 안에 넣기에 이른다. 인간의 마음은 바다다. 운하보다 넓다. 별을 바다에 모두 쓸어다 담아도 인간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가 말하고 싶은 전부다.
그는 완전하고 영원한 예술가를 강렬하게 소망한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작업이 절대 필요하다”
문의 : 010-2006-5943
| ▲ 작가 문학렬 1956년생 The University of Auckland (B.F.A) 04-06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1기 작가 개인전 / 2007 롯데화랑초대전(광주), 2002 예술의전당(서울), 1998 윤갤러리(서울), 1996 갤러리 그림시(수원), 1996 송원갤러리(광주) 단체전 / Islands Rhapsody (신안,광주,서울,), 용봉천 거리문화제 총감독 (전대 정문-북구청), 문화체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월드컵 경기장), 한국평면회화의 단면전 (전북예술회관), 황금돼지 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중흥3동 공공미술프로젝트 (중흥3동 와우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


